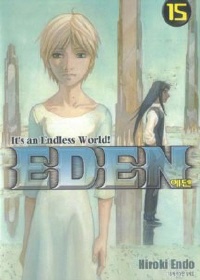지(知)의 개척 -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
1.
우리는 죽는 그 날까지 새로운 지(知)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지(知)의 영역을 거쳐왔을까? 너무 편식하진 않았을까?
한번이라도 이런 의문에 부딪쳐 본 사람이라면 일본 지(知)의 거장 다치바나 다카시(Tachibana Takashi)를 만나볼 것을 권한다. 스스로 끊임없이 지(知)의 영역을 개척해온 다치바나는 지(知)에 대한 우리의 엉뚱한 호기심을 격려하고 더이상 흐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어제의 지식 더미에 일침을 가한다. 아래는 그의 저서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2006, 청어람미디어)에서 발췌한 그의 메시지다.
호기심
지(知)의 목표
.....
이런 소재식 검사에 이용되는 세 가지 질문은 인류가 전 역사를 통하여 찾고자 노력해 온 목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 진정으로 깊이 있는 대답을 찾고자 기울여 온 노력이야말로 우리들의 과학이며, 문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p.33)
고전의 울림
나의 서재, 고양이 빌딩

2.
최근 한겨레21은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적 흐름으로 르포 문학을 재조명했다.
(관련 기사: '모든 게 무너지는 세상')
글은 <세계를 뒤흔든 10일(존 리드)>, <쏘다니는 리포터(키슈)>, <세계의 비참(EU)>와 함께 다치바나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르포문학은 지(知)의 침투와 함께 지(知)의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어쩌면 블로거들의 역할도 르포문학과 일부 궤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 여력이 된다면 제2회 한겨레21 르포상(2008.2.26~8.31)에도 도전해보기를.
'시나몬 주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낮은 하늘의 위안 (0) | 2008.05.26 |
|---|---|
| '피아노 묘지'에 가본적 있어? - 신동(2007) (1) | 2008.05.11 |
| 꿈으로 밥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5) | 2008.04.19 |
| Intellectual Accounts (1) | 2008.04.04 |
| 제 1회 북스타일 온라인 책 배틀!! - Book Style (0) | 2008.03.25 |